영조실록115권, 영조 46년 7월 6일 경술 1번째기사 1770년 청 건륭(乾隆) 35년
잦은 과거에 관한 일로 하교하다
주강을 행하고 하교하기를,
"근자에 온갖 폐단은 과거(科擧)가 잦은 때문에 생긴 것이다. 예전에는 절제(節製)를 거친 다음에 회시(會試)를 보고, 그 뒤에 직부 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으니, 아! 선비를 위하는 뜻이 참으로 거룩하였다. 옛법을 준수하여 문란한 일을 억제하는 것 역시 시의(時宜)에 맞추는 의리이니, 지금 이후로는 삼일제(三日製)·구일제(九日製)·황감제(黃柑製)는 일체 지난날의 준례에 따라 사제(賜第)하고, 인일제(人日製)·칠석제(七夕製)는 모두 회시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주되, 증광시·별시에 함께 부치고, 강경생(講經生)의 봄·가을 도기(到記)는 친림(親臨)·명관(命官)을 막론하고 구례(舊例)에 따라 모두 전시에 응할 수 있도록 하되, 수석을 차지 한 자가 많으면 비교를 하여 보아서 아주 뛰어난 한 사람씩을 일차(日次)로 전강을 보인 다음 모두 회시의 응시를 허락하되, 여기에서는 수석이 비록 많더라도 비교를 시키지 말라. 그리고 회시·급분(給分) 등의 모든 사항들은 식년(式年)의 구례대로 거행하여, 만년에나마 늦추었다 죄었다 하는 나의 뜻을 보여 주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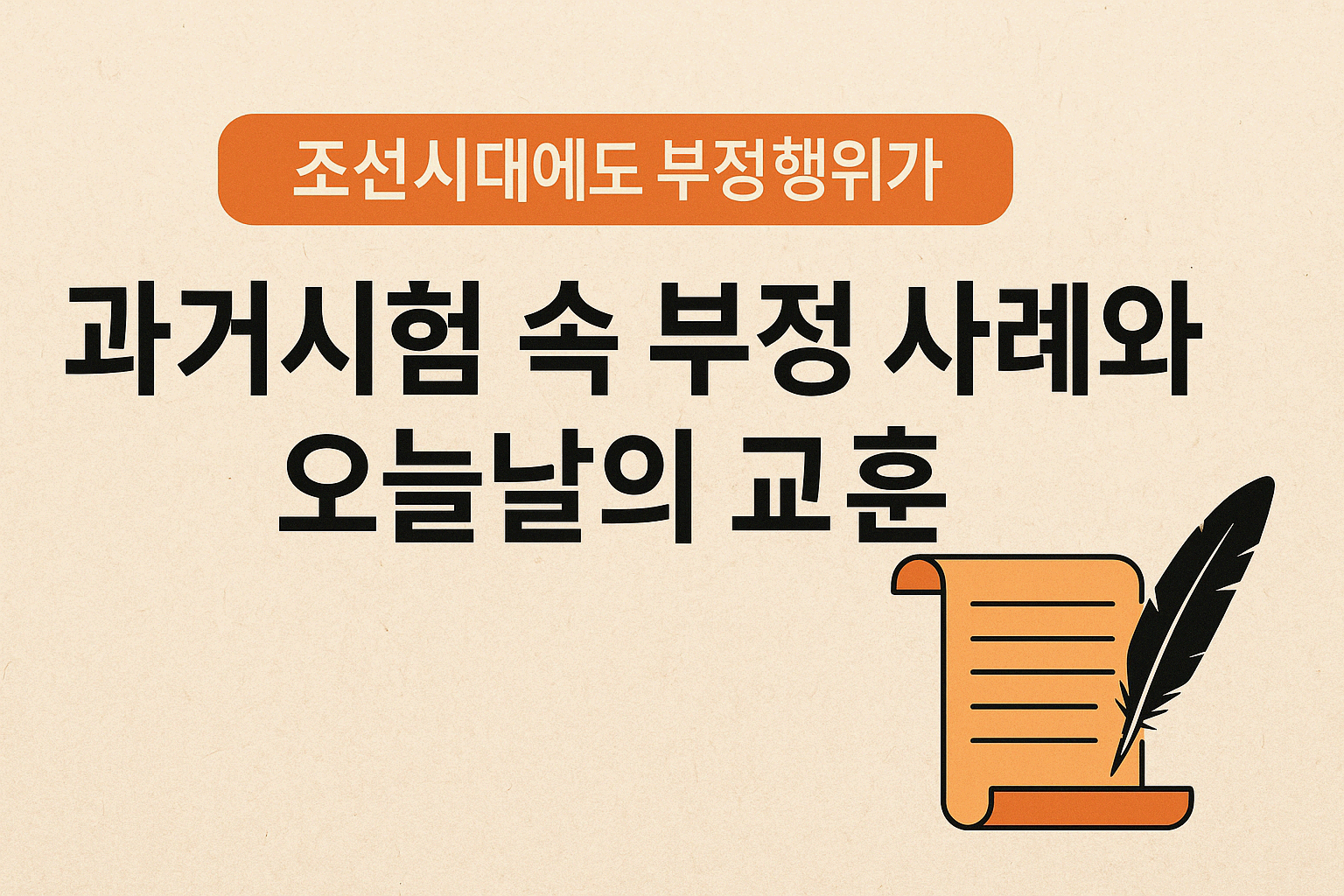
공정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의 중심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공정성이 무너지는 순간, 제도는 신뢰를 잃고 혼란을 낳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과거시험 속 부정행위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현대적 의미를 되짚어보려 합니다.
목차
- 조선시대에도 시험 부정행위가 있었다?
- '엄과장(嚴科場)', 흔들릴 수 없는 원칙
- 현대 사회에 주는 교훈: 공정성은 시스템의 기반
- 시대는 달라도 원칙은 같다
- 마무리
조선시대에도 시험 부정행위가 있었다?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은 관직 진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유혹도 컸습니다. 아래는 조선시대 한 국왕의 교지(敎旨)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지난 겨울 감장(柑場)과 지난번 삼제(三製) 때 유생들 가운데 책을 끼고 들어간 자도 있고, 사람을 데리고 들어간 자도 있었다.”
책을 몰래 들고 들어간 부정 수험생, 시험장에 외부인을 동행시킨 사례는 지금의 시험 커닝이나 대리시험과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이러한 부정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고, 승지나 대사성 같은 시험 감독자들까지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엄과장(嚴科場)', 흔들릴 수 없는 원칙
당시 국왕은 다음과 같은 강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과장을 엄히 한다(嚴科場)는 세 글자에 이르러서는 바꿀 수 없는 규제이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규범이었으며, 부정행위가 허용될 경우 시험 자체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 주는 교훈: 공정성은 시스템의 기반
오늘날에도 입시 비리, 채용 비리, 스펙 위조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이 존재합니다. 조선시대와 비교하면 형태는 달라졌지만, ‘공정성의 붕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엄격한 조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독자의 책임도 중요하다: 조선시대에도 시험 감독이 부정을 막지 못하면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들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 철저한 규칙과 고지: 수험생에게 사전 규정을 충분히 알리고, 위반 시의 처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신뢰 회복은 어렵고, 붕괴는 순식간: 한번 신뢰를 잃은 제도는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시대는 달라도 원칙은 같다
‘엄과장(嚴科場)’이라는 단 세 글자는 조선시대에도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최우선 원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6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정’을 갈망합니다. 부정행위를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사례가 말해주듯, 부정은 제도의 뿌리를 흔들고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마무리
조선의 국왕도, 오늘의 시민도 공정한 사회를 원합니다. 그 공정은 철저한 원칙과 단호한 집행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거울을 통해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人'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선 시대에도 인플레이션이 있었다?! (0) | 2025.08.25 |
|---|---|
| 조선시대 ‘내금위 사건’에서 본 오늘날의 직장 괴롭힘과 제도 미비 (0) | 2025.08.13 |
| 일곱 살 아이가 아이를 낳았다? 조선 시대 실록에 기록된 충격적 사건과 현대적 시선 (0) | 2025.08.03 |
| 실록과 데이터의 운명: 조선왕조가 남긴 기록 보존의 교훈 (0) | 2025.07.14 |
| 진관사 태극기: 수난의 역사 속에서 피어난 민족의 상징(이재명 대통령 태극기) (0) | 2025.06.09 |
| 오늘의 역사 - 18세기 제주에 표류한 류큐국 사람들 (0) | 2025.06.07 |
| 현충일의 유래와 국기 게양 방법, 현충일 영화 추천 (0) | 2025.06.02 |
| 단오: 음력 5월 5일,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전통 명절 (0) | 2025.05.21 |



